
낮아지는 여름
지역경기도 광명시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7-05-25

크리스마스 사랑의 기적
지역트래블투데이 LIST-i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4-12-24
삼청동 골목에서 사랑을 속삭이다
지역트래블투데이 LIST-i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6-08-08
미역국
지역강원도 고성군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7-02-15

작은 띠배에 담긴 큰 마음
지역전라북도 부안군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7-02-16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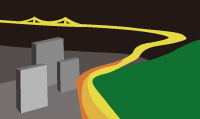
한 발짝 물러서서
지역부산광역시 연제구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7-02-15

쉴 곳이 필요한 자에게
지역충청북도 청주시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17-02-17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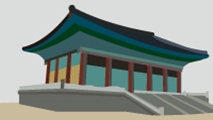
웃음이 나오는 절
지역인천광역시 강화군 글편집국 사진편집국 2021-05-17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